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㉗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발행 2020-06-12 11:45:26
수정 2020-06-12 11:45:26
이 기사는 447번 공유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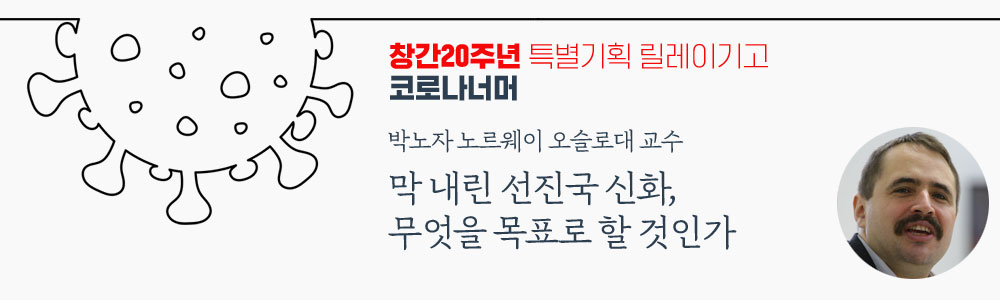
편집자주:2000년 5월 15일 첫걸음을 뗀 민중의소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와 후원인들의 성원과 격려로 민중의소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자주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진보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 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 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때 한국인들은 세계를 세 가지의 서열화된 영역으로 파악하기를 좋아했다. '중진국’인 우리는 한편으로는 구미권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을 지향해야 했는가 하면, 동시에 ‘후진국’들에게 ‘개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식의 세계관이었다. 이 세계관의 역사적 계보를 따지자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와 그 제자 유길준(兪吉濬)을 통해서 들여온, ‘문명-반(半)문명-야만’과 같은 구미 제국주의자들의 3층적인 위계적 세계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세계관은, ‘선진화’의 미명 하에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온갖 고통도, 국내에 노동자로 들어온 ‘후진국’ 출신에 대한 무시도 정당화했다. 그러나 코로나는 이 세계관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최고의 선진국으로 꼽혔던 미국과 일본의 위상은, 코로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중앙집권적 통제가 가능한 일본은 은폐로 일관했고, 은폐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의료체제의 모순과 엄청난 행정력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반대로, 미국의 침략으로 한때 황폐해졌던 ‘후진국’ 베트남과 미국의 등쌀에 계속 시달려온 쿠바는 ‘코로나 대응 모범국’으로 명성을 날렸다. 이와 함께 아이슬란드와 핀란드, 그리고 한국의 대응은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다. 쿠바와 핀란드, 그리고 한국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국가동원능력, 행정력의 우수성이다. 결국 ‘시장’이 할 수 없는 코로나 대응을 ‘국가’가 해냈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돼 종교시설, 학원, 영화관, 노래방, 음식점 등으로 확대 도입됐다. 2020.06.02ⓒ민중의소리
그러나 코로나는 행정력의 우수성 이외에 한국이라는 국가의 또 다른 면모도 보여주었다. 한국과 함께 ‘코로나 모범국’ 대열에 오른 핀란드에서는 전체 환자 중 약 8%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공공본위의 의료체제이자 무상의료다. 한국의 경우에는, 코로나와의 투쟁을 주로 담당했던 공공의료기관 보유 병상이 전체 병상 중 10%에 그친다. 각종 신종 전염병들이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지구온난화의 시대에 과연 이와 같은 공공성이 미약한 의료체제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핀란드나 아이슬란드는 무상의료지만, 한국은 여전히 병원에 가면 비급여 영역이 전체의 5분의 1 정도 차지한다. 문재인 정권은 2022년까지 건보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그것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과연 개인에게 상당한 자기부담을 요구하는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의료체계로는, 우리가 더 위험해지는 세계에서 제대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저(低)복지의, 유료의료와 유료대학교육 위주의 사회가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성장률이다. 2000년대만 해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4.6%였다. 중국·베트남과 같은 신흥시장과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고소득 사회 치고는 대단히 높은 성장률이다. 성장률이 비교적 높으면 소비자들에게 여유가 있어 취직에 실패한 사람이라도 자영업으로 먹고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이 그 자리를 지켰다는 점이다. 작년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층(15~29세)이 약 15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그들에게 도와주는 부모나 친척이 없었다면 아예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상당수 되지 않았을까 싶다. 성장이 주는 소비시장의 여유, 그리고 가정이 안겨주는 안정감으로는, 복지가 크게 부실해도 한국사회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미국·일본 등 서구 선진국 코로나 앞에 무너지고
한국·베트남·쿠바·핀란드 등 대응에 찬사
공공의료 부족·민간병원 의존 체계는 취약점
성장도 없고, 가정도 와해된 시대 복지국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성장은 당분간 어렵다고 본다. 올해는 -1.2% 정도의 역성장이 예상되며, 세계공황이 본격화하는 그 뒤로는 감 잡기조차 어렵다. 세계공황과 중-미 신냉전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에 더해 올해부터 한국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돼 사실상 경제성장의 시대가 끝났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리고 가정은 급속한 와해 과정에 있다. 이미 올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 정도 되며, 2050년이면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친척 사이의 ‘상부상조’에 대한 당위성이나 의무감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은 구미권 이상으로 개체화된 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과 가정이 맡았던 개인에 대한 경제적 보호막의 역할을 앞으로 과연 누가 맡을 수 있겠는가?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민중의소리
‘사회의 보호자’로서의 국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코로나 사태의 교훈대로, 결국 국가 이외에는 이 역할을 맡을 적임자는 없다. 단, 그러려면 국가는 전면적인, 빈틈없는 복지국가로 거듭나야 된다.
70%가 아니라 100% 건보보장률 달성이 국가의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을 증설하고, 대학교육을 국공립대학부터 점차 무상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 등록금을 마련해주는 시대도 이미 끝나가고, 무(無)성장 시대에 빚을 져서 등록금을 낸 청년이 졸업 후 취직해서 그 빚을 갚는 것도 대단히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공황과 자연재해의 시대에 복지국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는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